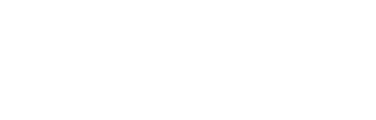새소식
[교수소식] 내과학교실 조정민 교수, dMMR/MSI-H 환자에 중요한 치료 선택지 된 '면역항암제'
- 의과대학 관리자
내과학교실 조정민 교수, dMMR/MSI-H 환자에 중요한 치료 선택지 된 '면역항암제'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불일치 복구(mismatch repair, MMR) 단백질이 이를 인식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MMR 단백질은 MLH1, MSH2, MSH6, PMS2의 4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현미부수체(microsatellite)는 1~10개의 짧은 DNA 서열이 반복되어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현미부수체에 일어난 돌연변이가 DNA 복구 단백질에 의해 복구가 되지 않아 변화가 발생한 것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이라고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MMR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해 암조직에 면역염색을 하는데 4개 중 하나라도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을 MMR 결핍(deficient MMR, dMMR or MMR-d)이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염색되는 것을 proficient MMR(pMMR or MMR-p)이라고 한다. PCR 검사나 NGS를 이용하는 경우 증폭되는 표지 유전자의 개수에 따라 MSI-High(MSI-H), MSI-Low(MSI-L), microsatellite stable(MSS)로 나누어지며 임상적으로 dMMR과 MSI-H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
dMMR/MSI-H가 중요한 이유는 암종에 상관없이 면역항암제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 선택을 위한 바이오 마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5% 정도가 dMMR/MSI-H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 NEJM에 발표된 KEYNOTE-177 3상 연구에서는 MSI-H/dMMR 가진 전이성 대장암 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펨브로리주맙(상품명 키트루다) 단독과 표준항암치료를 비교했는데 무진행 생존기간이 16.5개월 대 8.2개월로 펨브로리주맙 단독군에서 2배 이상의 긴 무진행 생존기간을 보였다.
펨브로리주맙 단독군은 질병진행 위험도를 40% 감소시켰고 이후 발표된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중앙생존값의 경우 펨브로리주맙 단독군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표준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36.7개월이었다. dMMR/MSI-H 대장암의 경우 그간 표준항암치료의 반응이 좋지 못했으나 면역항암제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현재 대장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에서 MMR/MSI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NEJM 발표된 NICHE-2 2상 연구에서 dMMR을 가진 115명의 국소진행성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상품명 옵디보)과 이필리무맙(상품명 여보이)의 병용요법을 투여했을 때 68% 환자에서 완전반응(잔존암이 없는 상태)을 보이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에서는 dMMR/MSI-H를 보이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니볼루맙과이필리무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CheckMate-8HW 3상 연구의 중간분석 결과가 발표됐는데 니볼루맙+이필리무맙 군의 무진행생존기간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고 항암치료군은 5.9개월로 확인되어 질병진행 위험을 79% 감소시켰다.
dMMR/MSI-H는 유전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린치증후군(Lynch syndrome)은 대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DNA 복제 유전자의 생식세포변이로 발생하며 유전이 되는 상염색체 우성유전 질환이다. 린치증후군의 70~80%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며 전체 대장암의 2~3%를 차지한다.
이 경우에서도 dMMR/MSI-H를 보이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dMMR/MSI-H가 있는 젊은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암, 자궁내막암 등의 가족력이 있거나 한 환자에서 대장암 외 자궁내막암, 요관암, 담도암, 췌장암 등 여러암이 발생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종마다 면역항암제의 반응의 차이는 있지만 dMMR/MSI-H를 가진 환자에서 면역항암제는 중요한 치료 선택지가 됐다. 선별검사를 통해 가능한 환자군을 찾아내 많은 환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민 교수는 부산대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아산병원에서 내과를 수련했으며,
현재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로 근무하며,
비뇨기암, 대장암, 담도암, 췌장암 등을 치료하고 있다.
대한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항암화학요법연구회 정회원이며,
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27